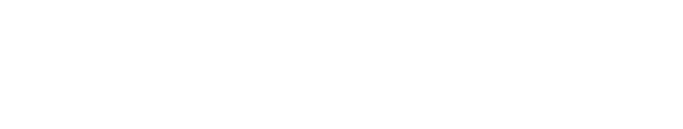‘100억’.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지원금 규모다.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대부분의 분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인디밴드’는 배제됐다. 인디밴드는 지원 대상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대중·기초예술 분야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 대중예술처럼 소비되지도, 순수예술과 같이 활동하지도 않아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인디밴드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인디밴드는 오랜 시간 한국 대중문화의 변두리에서 독창적 감수성과 실험성 등을 이끌어온 주체다. 인디밴드의 인디는 ‘독립된(Independent)’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로 기획사 등 거대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형무대보다 소규모 공연장과 지역사회를 주 무대로 삼으며 관객과 호흡하는 ‘현장성’ 을 중시한다.
이들의 현장성은 단순한 만남의 형식을 넘어선다. 인디밴드는 당대 사회의 분위기· 태도·문제의식을 가사와 사운드에 응축시킨다. 그렇게 형성된 음악은 곧 시대정신을 드러내며 기록을 넘어 다음 장면을 향한 방향을 제시한다. 1985년 들국화의 1집 중 <그것만이 내 세상>은 독재정권하에 자유를 억압당하던 시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청년에게 내면의 혁명으로 작용했다. 이 노래는 현재까지도 개인과 사회에 펼쳐지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돼주고 있다.
인디밴드가 시대정신을 오래도록 노래하기 위해선 관망적 자세를 가진 지원자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정부가 제도로써 담보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인디밴드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손길을 건네야 한다는 뜻이다. 인디밴드가 자생력을 갖춰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인디밴드의 현실을 조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서 구체적인 지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위에서 인디밴드는 현장성과 시대정신을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뜨거운 무대의 열기가 퍼져 시대를 달구는 그 날에 정부가 함께할 수 있길 염원한다.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