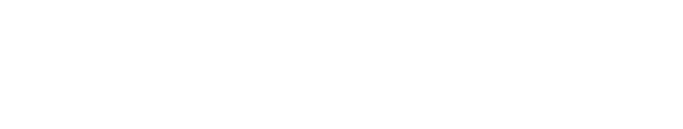‘생활체육’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4년 43.5%에서 2024년 49.5%다. 10년간 단 6% 증가에 그쳤다. 매년 투입된 수천억 원의 예산과 다양해진 생활체육 종목을 고려해보면 저조한 결과다.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이다. 경쟁과 성적을 위해 선수를 길러내는 ‘엘리트 체육’과 달리 생활체육은 생애 과정 전반에 걸쳐 있다.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고단한 삶 속 또 다른 힘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퇴근 후 한강변에서 달리며 그날의 고민을 덜어내고, 누군가는 단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낀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꾸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다른 탓이다. 레저스포츠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다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집중하고, 전문적 체육지도자 양성에 몰두하기도 한다. 한 가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당대 정부의 성과에 치중돼 단기적인 프로젝트만 반복되는 것이다.
분산된 부처 조직에서 수립하는 일관성 없는 계획도 문제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정책은 문체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이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는 각 기관마다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져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활체육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전담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예산만 인준받고 실질적인 정책은 하나의 부처에 일임하는 형태다. 실제로 잉글랜드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구인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를 운영 중이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해당 기구의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잉글랜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체육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 취미가 아닌, 평생 함께하는 생활체육이 되기를 바란다.
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