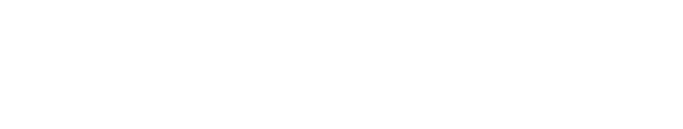개강과 함께 또 하나의 제도가 실험대 위에 올랐다. ‘자기설계전공’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전공은 창의융합대학 내 상상력인재학부에 속한 전공으로,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 전반부터 학위명까지 기획하는 ‘DIY(Do It Yourself)’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 교육은 이제 대학들이 앞다퉈 내세우는 전략이 됐다. 취업 시장에 걸맞은 인재를 기르거나, 전공과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에게 탐색의 시간을 주겠다는 명분에서다. 본교의 자기설계전공도 이 흐름에 편승해 등장했다. 상상력인재학부 학생이 전공을 신청한 후 전공 기초 교과목을 수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트랙·학과(부)·교내외·국내외 수업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본교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문제는 본교가 타 대학 수업까지 전공 과정으로 편입을 허용하며 그 의미를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름만 전공일 뿐 전공을 ‘외주화’시켜 마땅히 대학이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교육을 타 대학의 강의로 채워 넣는 셈이다. 왜 제집을 두고도 남의 집에 가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가. 그렇게 외부 수업에 의존하며 융합 교육이라는 허울을 치장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더 심각한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인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기설계전공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상상력인재학부나 지도교수와 상담하며 전공 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자기설계전공이 속한 상상력인재학부의 교수는 2명에 불과하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본교의 전임교원 1명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는 평균 31명에 이른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지만, 그 선택을 함께 설계해 줄 조력자를 충분히 확보했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대학본부는 자기설계전공을 통해 ‘본교를 대표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그 인재를 길러낼 지도 체계는 희미한 듯하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학생이 전공 과정을 기획하더라도 뼈대를 함께 만들어 줄 조력자도 부족한 현실이니 말이다. 학생 주도적 전공 탐색이라는 취지는 물론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마저 공허하게 들릴 정도다.
교육은 최소한의 기반이 깔려 있을 때 실현 가능하다. 지금의 자기설계전공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도 전가하는 형국이다. 대학본부가 진정으로 학생의 주도적인 전공 탐색을 가능케 하겠다면, 학생의 학문적 호기심을 함께 설계해 줄 땅부터 다지는 노력은 보여줬어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교육을 ‘셋방살이’처럼 불편한 구조 속에서만 융합 교육을 흉내 낼 것인가. 학생이 교육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곁에서 지지하고, 그 안에서 학문이 뿌리내릴 토대가 마련되는 그날이 오길 진정으로 바라본다.
이승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