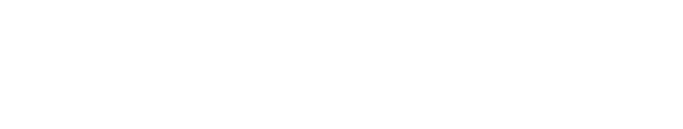한식은 이제 ‘먹는 음식’을 넘어 ‘보는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을 열면 떡볶이가 매콤하게 익어가고 라면 위에는 치즈가 사르르 녹는다.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 속에서 한국의 맛이 세계인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최근 K-Food 숏폼 콘텐츠를 살펴보며 느낀 것은 한식이 꼭 전통 음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식은 완벽함보다 친근함으로 사랑받고 있다. 누군가는 편의점 신상품을 감각적으로 소개하고, 누군가는 라면을 예술처럼 끓인다. 화려하게 차려진 한 상보다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짧은 영상 한 편이 더 큰 공감을 얻는다. 인상적인 점은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한식을 재해석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한식을 ‘한국의 음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보는 놀이’로 즐긴다. 국수를 김치로 돌돌 말은 김치말이국수를 만들거나 고추장과 버터를 섞은 고추장버터를 만들어 K-소스를 즐긴다.
오뚜기 함태호 재단과 함께, 해외에서 K-Food가 어떻게 이야기되고 또 소비자들이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숏폼 속 K-Food는 단순히 먹고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과 감각으로 새롭게 변주되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실제 소비자 경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아닌 해외 소비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K-Food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맛의 경험 넘어 직접 따라 해보려는 참여형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영상의 형식이 ‘어떤 한식을 경험하게 하는가’를 바꾼다는 것이다. 먹방은 화면 속에서만 끝났지만 조리 영상은 손을 움직이게 만들어 실제로 김치볶음밥을 따라 하게 했고 리뷰 영상은 편의점 신제품을 사보게 했다. 그리고 여행 콘텐츠는 한식당을 찾아가게 만들었다. 결국 K-Food 콘텐츠의 매력은 맛 그 자체보다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이야기 방식에 있었다.
이제 한식은 완성된 맛이 아니라 짧은 영상 속에서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다소 서툴고 어색하지만 각자의 취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그것이 오늘의 K-Food 콘텐츠다.
김보름(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