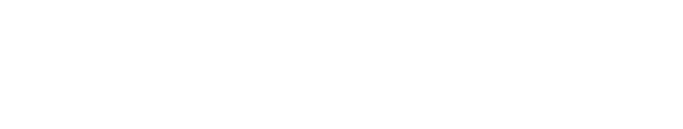이번 제39회 한성문학상 시 부문에 총 64인의 320편을 맞았다. 이들은 우리 곁에 시가 있으며 그 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가 쓰고 우리가 읽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증명하는 물증이라 하겠다. 유년 시절의 꿈 또는 치기, 사춘기의 낭만 또는 센티멘털 등이 남아있기도 했고, 여기에 청년기의 고독 또는 패기가 얹어지기도 했다. 대체로 행과 연의 나눔을 기반으로 한 ‘짧은 양식’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지만, 반면에 그것이 응축과 긴장을 내재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었다.
습관처럼 남을 트집 잡는 행동에 대한 자성을 드러내는 「트집」, 부지런한 드라이 크리닝으로 깨끗이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결해지지 않는 삶을 비추는 「드라이크리닝」, 불의가 난무하고 고통스러운 이웃을 외면하는세태에 맞서 ‘초인’의 의지를 드러낸 「비감」, 순한 음악소리의 재현을 꿈꾸는 「Acoustic」, 마을버스 한 대만의 교통수단에 의지하던 옛시절을 감각적으로 되살린 「흑백 영화」 등이 시선을 붙들었다. 형상화라는 문제에서 아쉬움이 있어 선 외로 밀려났다.
‘장미꽃을 지키는 가시’의 생태에서 ‘철조망을 감싸는 꽃’을 연상해 낸 「핀다」(홍서영)를 당선작으로 뽑는다. 대상에 집약하는 힘이 강하고, 그 강함이 시의 끝까지 가닿고 있다. 철조망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꽃이 자신의 피어남으로 그것을 압도해 버려서 결국 ‘철조망을 품은 꽃’으로 장식할 거라는 ‘이미지 스토리’를 빈틈없이 전면에 내세운다. 철조망이 전쟁이나 갈등을 상징하는 거라면, 꽃은 평화나 포용을 상징하는 것! 철조망 따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는 언제나 피어나는 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 이로써, 얼마간 ‘낙관주의’가 묻어난 약점마저 가릴 만하다고 봤다.
당선을 축하하고, 당분간 더욱 ‘시적인 시’가 어떤 것인가에 몰두하기를 응원한다.
박덕규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