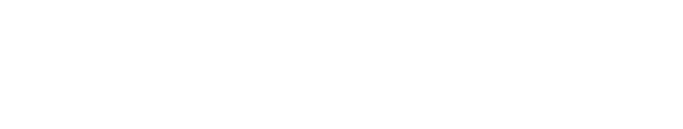자칫 무효가 될 뻔했던 재선거가 마무리됐다.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긴 덕분이다. 학생대표 후보자의 공약이 미비한 탓에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표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됐고, 투표 마감 직전까지 개표 가능 비율인 50%를 넘지 못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나서 학생자치기구 미선출 시 불이익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투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선거에 이어 또다시 50%를 겨우 웃도는 투표율이 기록됐다.
학생자치기구 선거 투표율은 학생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대변한다. 금번의 투표율은 절반 정도의 학생만이 학생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학생자치기구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도 학생대표로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약으로서 적절한가. 이외에도 이미 진행되던 대여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캘린더 배포와 같이 특색 없는 공약이 주를 이룬다. 학생을 위한 공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행되던 공약을 반복하거나 단순 오락에 그친다. 이를 미뤄보면 저조한 투표율은 예견된 결과다.
유권자인 학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공약은 기표소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에 제동을 가한다. 미비한 공약에 한 표를 행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 대표라면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학생회로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손을 내밀었어야 했다. 학생 대표는 변화의 주체로서 작용해야 하는 자리다.
학생자치기구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다. 양질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선출을 통해 조직되고,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 구상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불만을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뛰어다니면서 찾아야 한다.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말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학생들의 불만사항은 매년 반복되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약 찾기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보여주기식 단기적 공약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약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먼저 찾아서 긁어주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학생자치기구가 되길 고대한다.
김유성 편집국장